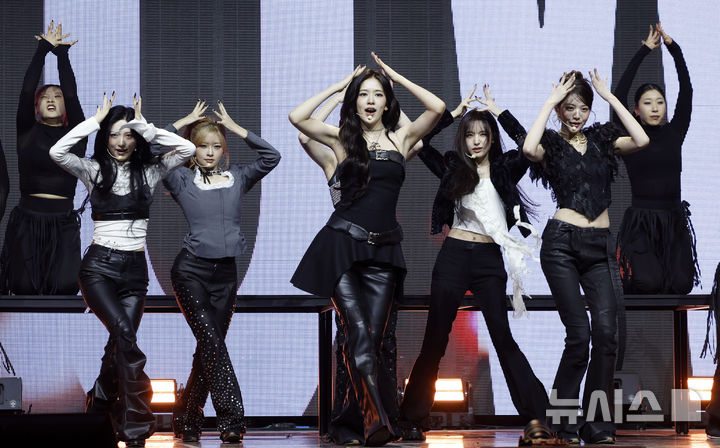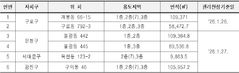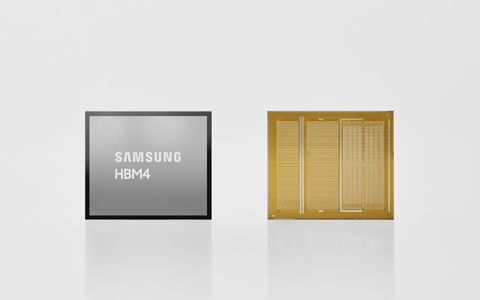[신간] 밭을 일구듯 시를 짓다…'기역은 가시 히읗은 황토'
![[신간] 밭을 일구듯 시를 짓다…'기역은 가시 히읗은 황토'](https://img1.newsis.com/2025/12/17/NISI20251217_0002021132_web.jpg?rnd=20251217174805)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노동자이자 농민으로 '따사롭고 환한 시'를 짓는다는 평을 받는 김용만 시인이 두번째 시집 '기역은 가시 히읗은 황토'(창비시선 529번)을 펴냈다.
1987년 '실천문학'을 통해 작품활동을 시작한 저자가 등단 34년 만에 첫 시집을 펴낸 이후 4년 만에 선보인 신작이다.
시인은 대지의 언어와 정겨운 토속어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이모저모를 진솔하게 기록한 '산중 일기'를 들려준다.
"오늘도 묵정밭에 나가 밭두둑을 만들었다/ 한삽 떠 우측으로/ 한삽 떠 좌측으로/(…) 칭찬에 인색한 마을 할머니/ 농사도 공단처럼 이쁘게 짓는다며/ 칭찬을 한바가지 놓고 가셨다/ 기분이 아주 좋았다/ 그런데 왜 밭두둑이 휘었냐고?/ 그게 어머니 아버지 살았던 길이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다/ 자연은 꼬부장한 게지" ('묵정밭 3' 중)
"나무의 일은 하늘을 향해 바로 서는 것이고/ 땅의 일은 수평을 이루는 것이다/ 사람의 일은 수평과 수직을 지키는 삶이다" ('사람의 일' 중)
김용만의 시에는 몸으로 살아낸 노동의 시간과 땀 냄새가 짙게 배어 있다. 시인은 '마찌꼬바'(작은 공장을 뜻하는 일본어) 용접사로 살았던 과거의 시간과 산중에서 땅을 일구고 시를 쓰는 현재의 시간을 겹쳐놓으며 노동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긴다.
"마찌꼬바 삼십년 세월"을 "쇠토막같이 언 손으로/ 종일 난간 움켜쥐고 매달"('고드름')려온 생애는 고되고 질긴 노동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외롭게 살았"으나 "한세상 비겁하진 않았다"('보리밥을 먹다가')고 회고한다.
시인의 산중 생활은 귀촌살이가 아니다. 시인은 흙 한줌, 돌 하나도 소홀히 대하지 않는다. "돌 고르고 나니 흙이 남"아? "그 흙을 옮겨 꽃밭을 만들"고, "흙 고르고 나니 돌이 남"아? "그 돌로 돌담을 쌓"('겨울,? 산에 기대어')아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공생공락하는 삶을 꿈꾼다.
"잘 짓든 못 짓든/ 나누는 것도 농사다"('감자 캤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시인은 노동의 목적을 '나눔'에서 찾는다.
장식적인 삶 대신 생명을 기르는 노동을 택한 시인의 문장은 각박한 세상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깊은 평화와 위로를 준다.
김용만 시인은 전북 임실에서 태어나 전주대 국어국문과를 졸업했다. 잠시 서울 생활을 접고 아내가 있는 부산으로 내려가 공장 용접공으로 30여 년 근무 후 퇴직했다. 지금은 전북 완주 산골에 터를 잡았다. 시집 '새들은 날기 위해 울음마저 버린다'를 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