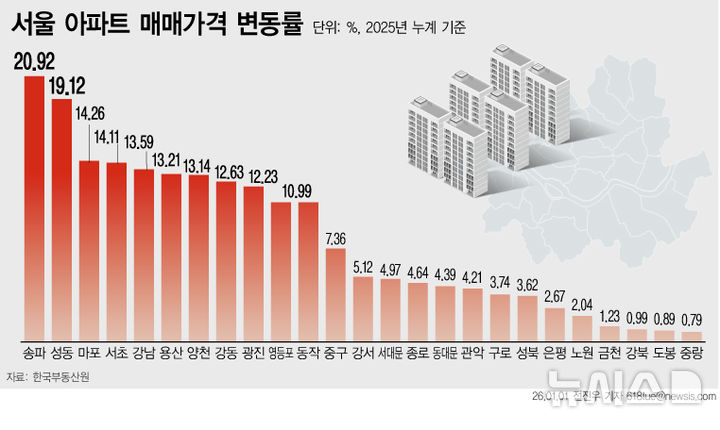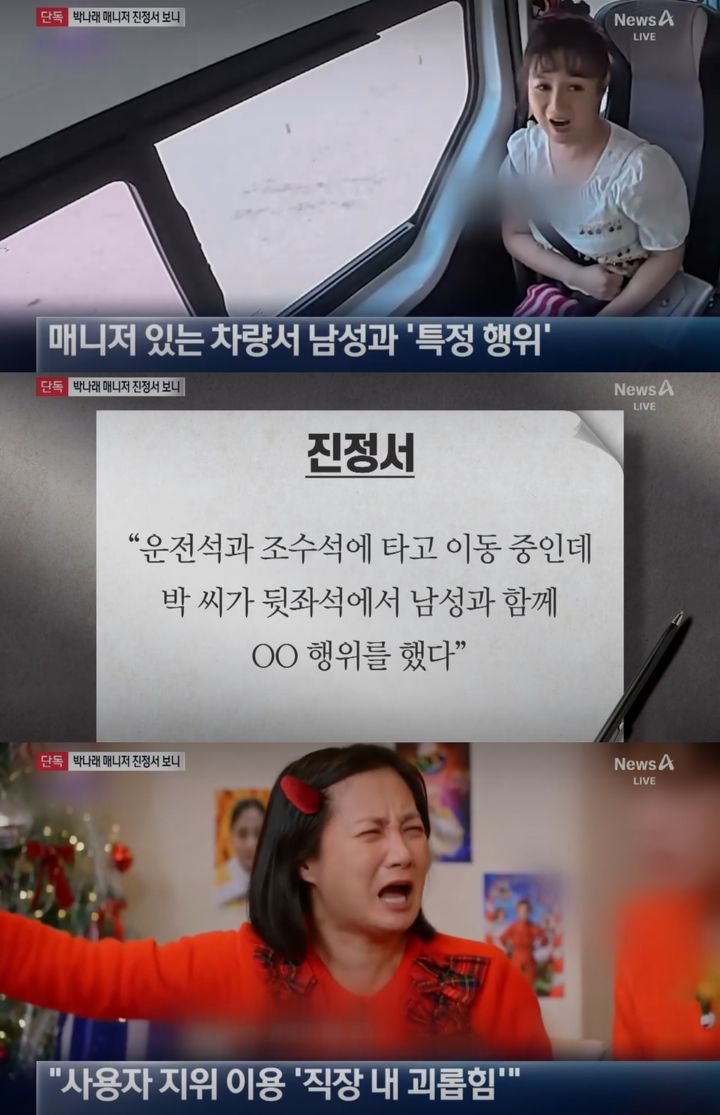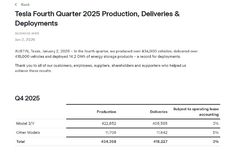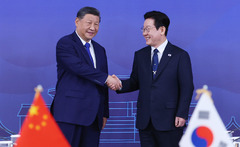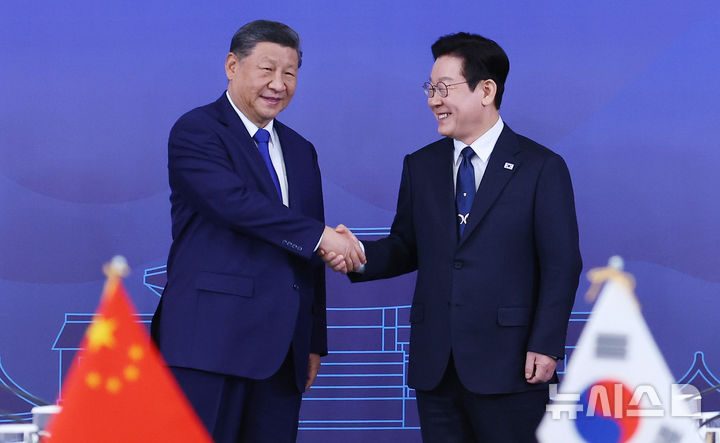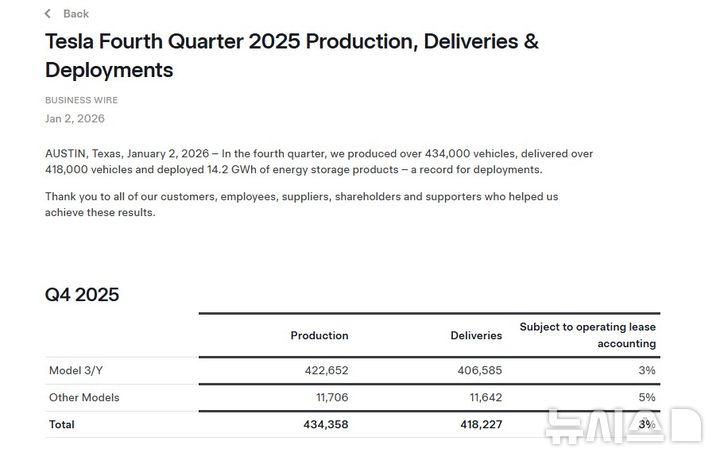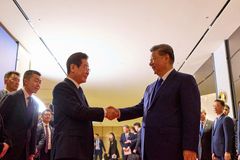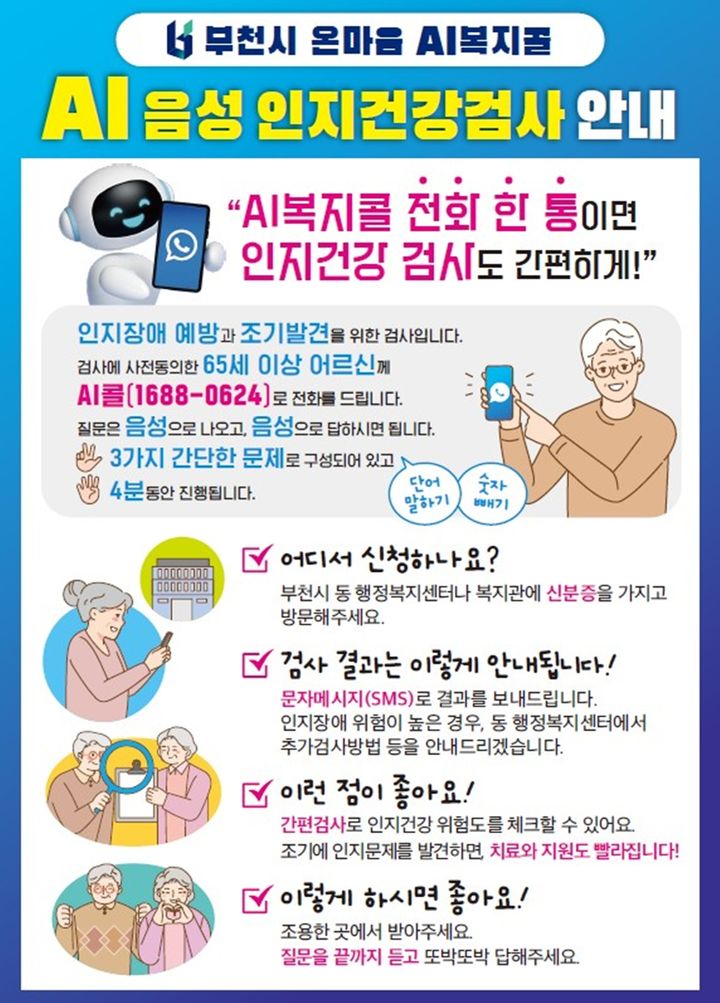'카슈미르 분쟁' 인도·파키스탄, 제2막 '인더스강 분쟁' 예고

【카슈미르=AP/뉴시스】14일(현지시간)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에서 몬순 홍수로 수백 명이 사망한 가운데 주민들이 짐을 머리 위에 이고 이동하고 있다. 2014.09.15
BBC에 따르면 인도는 최근 인더스·젤룸·체나브 강의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거대한 댐과 운하 건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우선순위로 두고 있던 수자원 프로젝트의 일부다. 모디 총리는 "정부의 태스크포스팀이 수자원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밝히기도 했다.
인도의 한 고위 관리는 BBC에 "공은 굴러가기 시작했고 조만간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대부분은 새로운 댐을 짓는 일이 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1960년 파키스탄과 체결한 '인더스 강 조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분쟁이 예측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양국을 지나는 강물을 두고 다투다 1960년 세계은행의 중재로 인더스 강 조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라비·베아스·수틀레지 등 카슈미르 동부 3대 강은 인도가, 인더스·젤룸·체나브 등 서부 3대 강은 파키스탄이 각각 관할한다. 인더스·젤룸·체나브 강 상류에 위치한 인도는 유량의 20%만 사용하고 80%를 파키스탄에 보내기로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수자원 문제를 이용해 카슈미르 분쟁으로 대립하는 파키스탄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양국 관계는 지난 9월 무장괴한이 카슈미르 지역 육군 기지를 공격해 인도군 18명이 숨진 사건 이후 급격히 악화됐다.
인도가 1987년 시도했다가 파키스탄의 반발로 중단한 젤룸 강 상류댐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알려진 것도 이 시기다.
수자원 전문가들은 인도가 인더스 강 상류에서의 물 사용을 극대화하면 파키스탄과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도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이번 결정이 정부의 파키스탄을 향한 의도를 담고 있다"며 "인도가 젤룸 강의 물을 통제하면 파키스탄의 농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인도 수자원부 관계자들은 "인더스 강 조약에 잘 들어 맞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자원 프로젝트로 현재 물을 대고 있는 80만에이커(32억3756만3874.99㎥)를 140만에이커(56억6573만6781.23㎥)까지 확대하고 1만9000밀리와트의 전기를 추가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물, 평화 그리고 안보’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말레차 로디 UN 주재 파키스탄 대사는 "인더스 강 조약은 한쪽 당사국에 의해서 협정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라며 물을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인도가 인더스 강 조약 재검토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에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온다. 중국은 최근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티베트자치구 남부를 흐르는 아로장포강의 지류를 막았다.
수자원 전문가 히만슈 타카르는 "인도가 서부 강에서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도는 중국이 인더스 강과 아로장포강 상류에 있는 국가이며 파키스탄의 동맹국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가 일부 인도 관리들의 예측처럼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