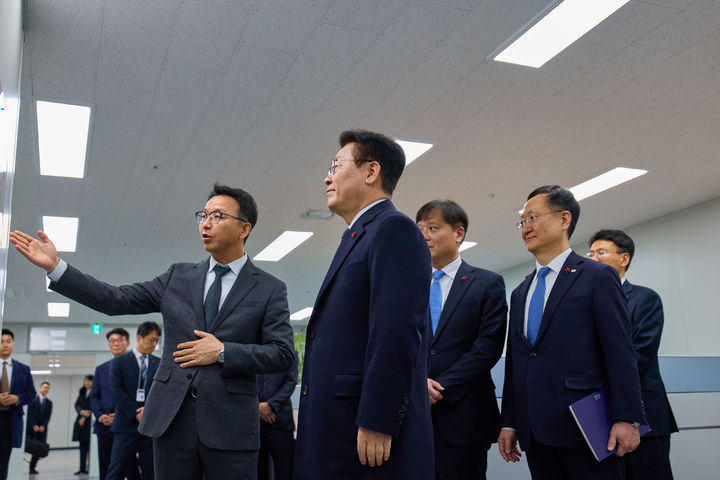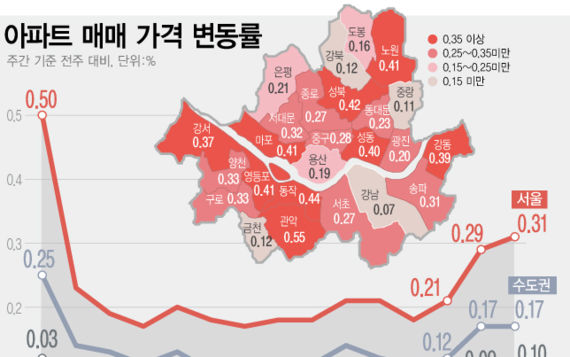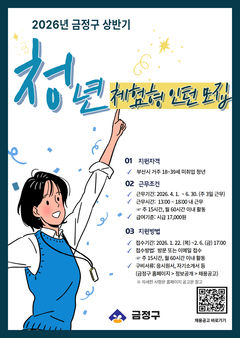당연한 것은 없다…AI 시대 다시 읽는 '형태의 문화사'

[서울=뉴시스] 박현주 미술전문 기자 = 인공지능이 형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시대, 질문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 형태는 누구의 몸에 맞춰졌는가.
둥근 동전과 네모난 지폐, 반듯한 빌딩 사이를 비집고 남은 구불구불한 골목길.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 오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이 책 '형태의 문화사'(한길사)는 당연함을 의심하는 책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사물과 공간은 과연 중립적인가, 아니면 특정한 몸의 기억이 굳어버린 결과인가.
영국 노섬브리아대 건축학과 교수인 저자 서경욱은 손과 발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신체에서 출발해 문명 전체를 다시 읽는다.
문고리의 지름, 공의 크기, 지폐의 비율 같은 수치는 우연이 아니다. 다섯 손가락으로 쥐고 돌리기 위해, 주머니 속에서 걸리지 않기 위해, 형태는 언제나 인간의 몸을 기준으로 선택되어 왔다. 문명은 추상이 아니라 몸의 경험이 축적된 물질적 기록이다.
동전이 둥근 이유는 미학이 아니라 생활의 물리학 때문이다. 어느 방향으로도 모나지 않아야 하고, 손 안에서 자연스럽게 굴러야 한다. 반면 지폐는 쌓고 접고 넘기기 위해 직사각형을 택했다.
한국 지폐의 짧은 변 6.8센티미터는 인간의 손아귀가 허락하는 가장 안정적인 치수다. 형태는 상징이 되기 전에 이미 몸의 결정이다.
길도 마찬가지다. 종이 위에서 설계된 직선은 권력의 질서이고, 사람들이 발로 디디며 만든 곡선은 삶의 궤적이다.
뉴욕 맨해튼의 격자를 가로지르는 브로드웨이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걷던 길 위에 놓인 현재다. 효율이 아무리 직선을 밀어붙여도, 인간의 발은 끝내 제 몸에 맞는 길을 남긴다.
그러나 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형태는 몸이 만들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형태가 몸을 길들인다. 바퀴가 지나간 자리가 길의 폭을 정하고, 그 폭은 다시 다음 바퀴의 크기를 제한한다.
우연은 표준이 되고, 표준은 다양성을 지운다. 우리가 느끼는 ‘편안함’은 오래전 굳어진 형태에 순응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온돌과 마루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바닥이 생활의 중심이 되면서 사람은 앉고 눕는 몸이 되었고, 신발을 벗는 행위는 위생을 넘어 안과 밖을 가르는 문화가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경계는 벽이 아니라 몸의 동작으로 확인되는 감각적 질서다.
"모든 스마트폰 업체는 경쟁적으로 물리적 버튼을 없애고, 배터리 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모든 슬롯과 포트를 숨기거나 없애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는 딱딱하고 견고한 덩어리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완벽한 봉인은 돌로 만든 모노리스의 축소판과도 같다. 마치 선사 시대 사람들이 거석을 숭배했던 것처럼, 현대인은 스마트폰의 미스터리한 완결성을 숭배한다."(287쪽)
책의 마지막에서 질문은 미래로 향한다. 인공지능이 형태를 설계하는 시대, 우리는 더 이상 ‘예쁜가’만을 물을 수 없다. 이 형태는 어떤 평균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는가. 어떤 몸은 포함되고, 어떤 몸은 예외로 밀려났는가.
'형태의 문화사'는 문명을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가 어떤 몸으로 살아왔고, 앞으로 어떤 몸이 되어갈 것인지를 묻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