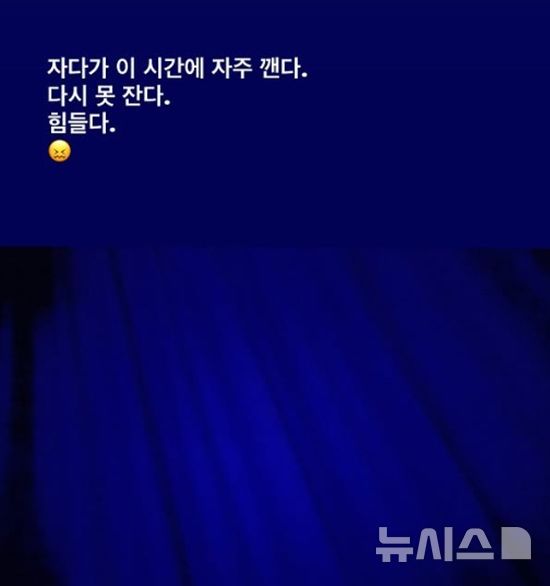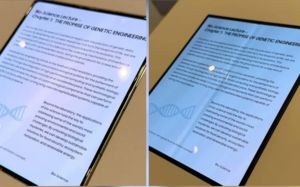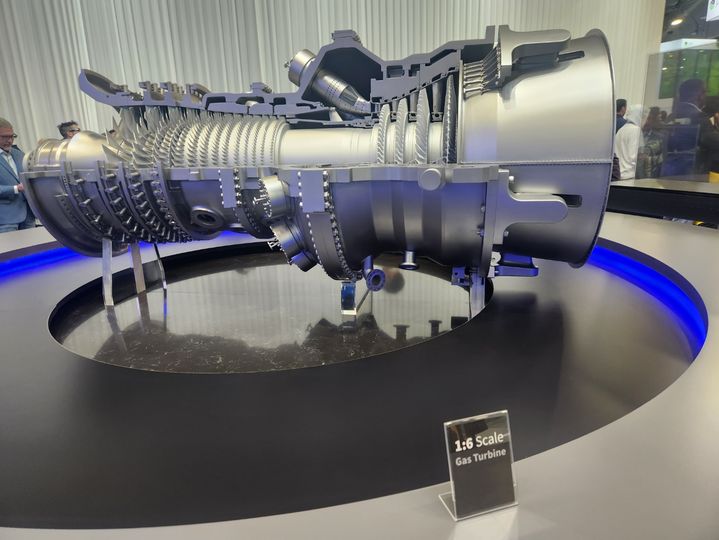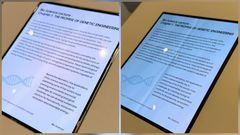고액납세자 불복에 작년 법인세·증여세 등 1311억 감세
국세통계 분석 결과 작년 감세액 비율 19.7% 최고
세액 10억 이상·법인세·증여세 감세율도 사상 최대
![[천안=뉴시스] 사진은 지방 세무서 모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0/21/NISI20221021_0001111597_web.jpg?rnd=20221021133636)
[천안=뉴시스] 사진은 지방 세무서 모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지난해 조세불복으로 이의신청을 통해 줄어든 세액이 1300억원을 넘어서며 12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이의를 제기한 세액 대비 실제 줄어든 비율은 20%에 육박해 역대 최대 수준이다.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감세 규모가 두드러졌는데 법인세·상속세·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감세액이 뛰었다.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중심 감세 기조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뉴시스가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이의신청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감세액 비율은 19.7%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개인 또는 법인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를 받으면 이의신청 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 환급이나 감면신청을 했는데 처리되지 않은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감세액은 전체 처리대상 세액 중 실제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감세해준 금액을 의미하는데, 신청세액(처리세액) 대비 감세액 비중이 감세액 비율이다.
2008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감세액 비율은 8~9% 수준이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살펴봐도 2018년(10%)을 제외하고 한 자릿수에 그쳤는데 지난해 이 비율이 두 배 이상 뛴 것이다.
전체 처리세액은 줄어든 반면 감세액 규모는 늘어나면서 비율이 급등했다. 처리세액은 2017년 9320억2700만원, 2018년 7806억200만원, 2019년 7833억500만원, 2020년 1조1530억4000만원, 2021년 1조687억76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6660억300만원으로 줄었다.
반면 감세액은 2017년 840억7900만원, 2018년 784억4500만원, 2019년 672억6300만원, 2020년 499억8800만원, 2021년 862억5600만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 1311억6300만원으로 뛰었다.
지난해 전체 이의신청 세액 총 6660억300만원 중 1311억6300만원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감세액 규모는 2010년(1474억1700만원) 이후 12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인용률은 13.1%로 전년(18.8%) 대비 5.7%p떨어졌다. 고액세납자를 중심으로 감세액과 감세액 비율 모두 폭등한 영향이다.
청구세액규모별로 살펴보면 10억원 이상이 854억3100만원을 감면받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감세액 비율은 25.3%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역대 최대 감세액 비율을 기록한 2018년(7.3%) 대비로도 3.5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은 2021년 19.9%에서 지난해 10.1%,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도 19.4%에서 10.8%로 감세액 비율은 오히려 줄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증여세·부가가치세의 감세액과 비율이 모두 두드러졌다.
법인세 감세액이 479억3500만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처리세액(1217억7700만원) 대비 비중도 39.4%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증여세 감세액은 158억8600만원으로 비율은 27.6%에 달했다. 이는 앞서 비중이 가장 높았던 2019년(19.8%)과 비교해도 8.8%p 높은 수준이다. 부가가치세 감세액도 274억3000만원으로 25.0%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인용율은 줄었는데 감세액과 감세액 비율이 올랐다는 것은 국세심사위원회가 높은 세액 위주로 이의신청 인용을 많이 해줬다는 의미"라며 "세목이 법인세 위주로 증가했다는 점도 정부가 작년에 법인납세자들 위주로 세금을 많이 빼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