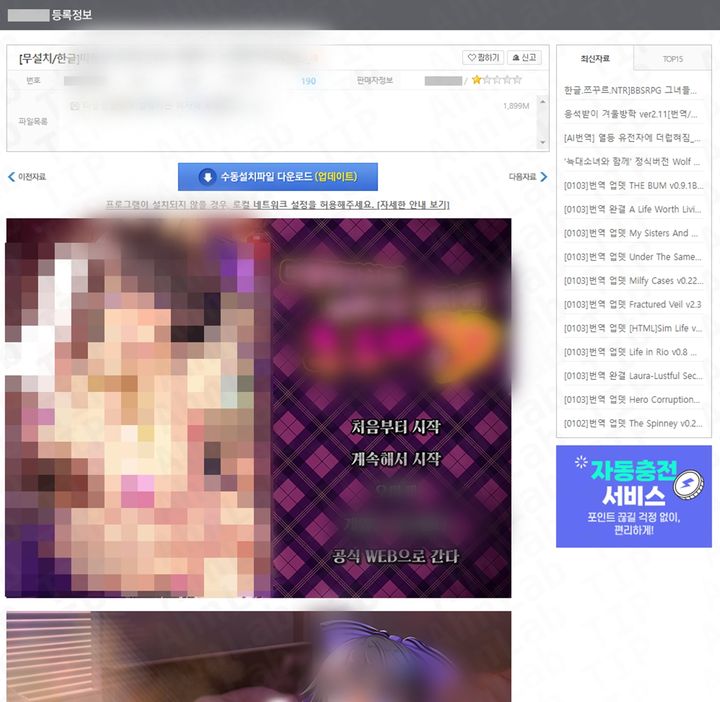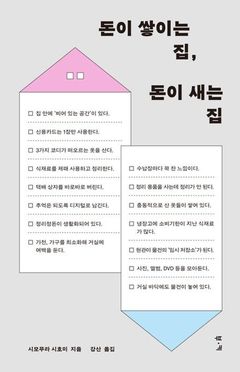[주목! 이사람] 삼양옵틱스 황충현 대표 "국내 유일 카메라 업체…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것"
2013년 삼양옵틱스 구원투수로 와 OEM·CCTV 사업부문 정리 및 MF·AF 주력으로 삼아
2014년 500억원 매출액 지난해 663억원으로 증가…지난해 5000만불 수출탑 수상 쾌거
인력 수급 부분은 어려워 푸념…"대기업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기술 이전 적극 고려해야"
![[주목! 이사람] 삼양옵틱스 황충현 대표 "국내 유일 카메라 업체…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것"](https://img1.newsis.com/2018/09/20/NISI20180920_0000205051_web.jpg?rnd=20180927145350)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황충현 삼양옵틱스 대표는 "삼성전자가 카메라 시장에서 철수한 이후 삼양옵틱스는 국내에서 유일한 교환렌즈 전문업체로 독일 카를 차이스와 소니, 니콘 등 일본 기업에 맞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삼양옵틱스 서울 사무소에서 뉴시스 기자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회사는 중소기업이지만 삼성전자가 카메라 시장에서 철수한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교환렌즈를 생산하며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72년 한국와코(WAKO)로 출범한 삼양옵틱스는 1979년 삼양광학공업을 거쳐 2002년 변경된 사명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가 제조한 사진기와 호환되는 교환식 렌즈를 개발한다.
처음에는 CCTV와 하이브리드 비구면, 플라스틱 비구면 렌즈 등을 생산했지만 2008년에 DSLR 교환렌즈 85㎜ F.1.4를 출시한 이후 2009년 DSLR 교환렌즈 8㎜ F3.5 등 다양한 신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현재는 포토렌즈 라인업, 씨네렌즈 라인업, 전문 영상 시장을 겨냥한 전문가용 씨네렌즈 씬(Xeen) 라인업 렌즈 등 총 62종의 렌즈를 생산 중이다.
회사의 대주주는 설립 이후 수차례 바뀌기도 했다. 1989년부터 삼양광학공업은 파업과 수출 부진 등의 여파로 경영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1989~1991년 연속 적자를 낸 삼양광학공업은 250억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1992년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10여년간 최대주주 없이 경영을 하다 2000년 11월 비상장회사인 폴스타에 인수됐다.
폴스타는 폐쇄회로TV(CCTV)를 주로 생산하던 회사로 삼양광학공업의 경쟁사였다. 이 해에 삼양광학공업은 법정관리를 벗어났다.
2002년 삼양광학공업의 최대주주는 김덕수 씨로 다시 바뀌었다. 이 해에 회사 이름을 지금의 삼양옵틱스로 바꿨다.
이후 삼양옵틱스의 주인은 동서정보기술로 바뀌었다가 2004년 일본 도드웰 BMS로 다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몇 차례 감자를 했고, 자본잠식 상태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
2013년 VIG파트너스(옛 보고펀드)가 삼양옵틱스를 인수하면서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의 광디지털사업 영업 마케팅 상무를 지내고, 삼성디지털이미징과 삼성전자에서 이미징 마케팅 상품기획 상무를 역임한 황 대표가 어려워진 회사를 살리기 위해 구원 투수로 나섰다.
![[주목! 이사람] 삼양옵틱스 황충현 대표 "국내 유일 카메라 업체…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것"](https://img1.newsis.com/2018/09/20/NISI20180920_0000205052_web.jpg?rnd=20180927145350)
그는 회사를 독립(물적불할) 시키면서 교환렌즈 부문을 주력 사업으로 정하는 한편 매출 비중이 40%에 이르던 CCTV 렌즈 부문을 과감히 정리했다.
황 대표는 "삼양옵틱스에 와보니 OEM(주문자생산방식)으로 다수의 상품을 생산하고 있었다"며 "OEM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제품으로 승부를 해야 할 지 고민한 끝내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성장성이 희박한 OEM 사업과 CCTV 렌즈 부문을 과감히 정리하고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는 매뉴얼 포커스(MF) 제품과 오토매틱 포커스(AF·자동초점) 렌즈를 주력으로 삼았다.
황 대표는 "당시 회사가 MF 제품 위주로 생산하고 있었던 것도 문제였다"며 "MF 제품 시장은 독일의 카를 차이스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했지만 중국 업체들의 성장 속도도 무시할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MF 제품만 고집하다가는 중국에 따라잡힐 수 있었기 때문에 AF 제품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를 개발하기 위해 인력을 보강하는 데만 2년이 넘게 걸렸고 제품을 개발하는 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AF 렌즈시장은 MF 렌즈시장보다 20배 가량 크지만 이미 소니, 파나소닉, 올림푸스, 니콘 등 일본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황 대표의 도전은 무모해 보이기도 했다.
광학 설계와 응용기술 등이 뒷받침 되지 못한다면 기존 기업과의 경쟁이 될 리 없고 소비자들도 외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AF 렌즈 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황 대표는 AF 제품 개발에 매달렸고 2년반 연구 끝에 2016년 AF 렌즈를 출시하게 된다. 제품이 출시된 이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AF 제품군은 한달에 6~7000대 판매를 목표로 본격 양산됐지만 시장에서의 주문 물량은 예상을 뛰어넘어 물량을 소화하지 못할 정도였다.
2014년 500억원 수준의 매출액은 2017년 663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144억원 수준에서 2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5000만불 수출 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주목! 이사람] 삼양옵틱스 황충현 대표 "국내 유일 카메라 업체…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것"](https://img1.newsis.com/2018/09/20/NISI20180920_0000205053_web.jpg?rnd=20180927145350)
황 대표는 MF 렌즈와 AF 렌즈 라인업을 꾸준히 보강하며 회사 매출을 올리는데만 열중하지 않았다. 그는 동영상 VDSLR 렌즈와 영화 촬영용 시네마 광각렌즈 시장으로 회사의 라인업을 확장시켰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그는 "영화 전문 카메라의 경우 큰 렌즈를 사용하는데 유럽 회사들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며 "영화용 렌즈가 워낙 비싸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빌려서 사용한다. 렌탈 시장을 구매 시장으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황 대표는 "품질은 100~200년 된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의 8~90%지만 가격은 절반 이하로 영화용 렌즈를 출시하자 업계의 반응이 비교적 좋았다"며 "렌탈을 해서 영화용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소유의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사업을 전개하며 코트라의 지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황 대표는 회상했다.
삼양옵틱스는 월드 챔프 수출 전문기업으로 지난 2017년 선정 돼 코트라의 도움을 받아 유럽 전시회 등에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확 끌어올린 것이다.
또 유럽 현지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총판 개념을 두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데 코트라 등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이용해 현지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었던 부분도 매출 향상에 긍정적인 요인이 됐다고 황 대표는 밝혔다.
![[주목! 이사람] 삼양옵틱스 황충현 대표 "국내 유일 카메라 업체…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것"](https://img1.newsis.com/2018/09/27/NISI20180927_0000206305_web.jpg?rnd=20180927145350)
삼양옵틱스는 오는 29일까지 독일 퀼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사진·영상기자재 전시회 '포토키나(PhotoKina) 2018'에도 참가하고 있는 중이다.
포토키나 전시회는 캐논, 니콘, 소니를 비롯한 전세계 모든 포토 이미징 관련 회사들이 참가하는 전시회로삼양옵틱스도 2년마다 개최되는 이 전시회에 지난 2016년에 이어 참가하여 삼양브랜드를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고있다.
교환렌즈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는 옛 직장인 삼성전자 출신 임직원을 대거 영입해 회사 진용을 갖췄고, 매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파격적 경영을 선보인 그가 앞으로 꿈꾸고 있는 미래는 어떨까.
황 대표는 "삼양옵틱스라는 회사를 100년 기업으로 끌고 나가기 위한 기초와 방향성 설정에 매진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미래에도 경쟁력 있는 회사로 남기 위해 기술을 접목하고 이를 내재화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력 수급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황 대표는 푸념했다.
물리학의 한 분야인 광학은 분야가 넓고 광범위해 인재를 찾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전자, IT 분야와 겹치는 경우가 많아 인재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실제로 황 대표는 옛 직장에서 인재를 영입하려고 했지만 무산된 적도 다수 존재한다고 귀띔했다. 그는 "많은 청년들이 지방 근무를 하지 않으려는 것도 있고 우수 인력이 중소기업에 들어오더라도 2~3년 근무를 한 뒤 대기업으로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하지 않는 풍조를 바꿔야 한다"며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차원에서 기술을 전수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내놨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