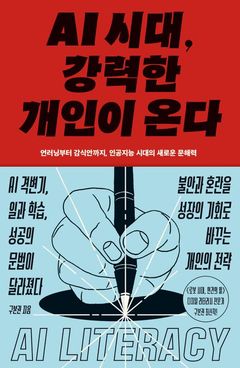[한상언의 책과 사람들] 낡은 것을 지킨다는 것
![[서울=뉴시스] 1960년대 묵호극장 사진(사진=한상언 영화연구소대표 제공) 2023.04.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4/28/NISI20230428_0001254364_web.jpg?rnd=20230428172836)
[서울=뉴시스] 1960년대 묵호극장 사진(사진=한상언 영화연구소대표 제공) 2023.04.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선물의 위력은 컸다. 해가 떨어져 날이 선선했음에도 서원 뜰에 마련된 야외 객석에 앉은 청중들은 귀를 쫑긋하며 집중했고, 행사 분위기는 시종 화기애애했다. 생각해보면 선물이란 크건 작건 상관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대신 전달하는 것일 테다. 우리의 즐겁고 고마운 마음도 선물을 통해 객석에 그대로 전달됐을 것이다.
행사 시작 전 유 화백과 나는 서원 근처의 부대찌개 집에서 김성진 동해예총 회장, 이중성 신아일보 기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처음 뵙는 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라 낯설었지만, 소탈한 분들인지라 불편하지는 않게 식사할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나는 수능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일출을 보러 청량리에서 밤기차를 타고 동해에 내려 겨울 해변에서 사나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 뜨는 모습을 기다렸던 20여년 전 기억을 떠올렸고, 그때 동해극장 앞에서 찍은 사진도 한 장 남아 있다는 말을 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김성진 선생은 동해극장의 원래 이름은 묵호극장이었는데 묵호가 동해로 커지면서 이름이 바뀌었다고 했다. 나는 묵호극장이라는 이름에 갑자기 호기심이 동했다. 몇년 전 영상자료원에서 발주한 일제강점기 전국의 극장에 대한 조사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묵호극장에 관해서도 조사했었다. 그때 조사 내용은 아주 간략했다. 1943년 당시 묵호극장은 가설극장이었고 극장주는 환전우삼(丸田祐三), 해방 후에도 일본인 극장주의 이름을 따서 환전극장이라고도 불렀다는 내용 정도였다. 일제강점기 묵호는 강원도의 조그만 어항이었던지라 원체 자료가 없었다. 내가 서술할 수 있는 내용도 이 정도였다.
나는 사진작가이기도 한 김성진 선생께 묵호극장의 사진이 있는지 물었다. 선생은 동해시 개청 40주년 기념사업으로 동해예총에서 발간한 ‘동해시 역동의 기억’이라는 사진집이 있는데 그 책에 묵호극장 사진이 실려 있다며 한 부 보내주겠다고 했다.
며칠 후 동해시의 과거 모습을 수록한 두툼한 사진집이 천안의 노마만리로 배달돼 왔다. 책을 펼쳐 묵호극장의 모습을 찾아봤다. 69페이지에 1960년대 묵호극장의 모습이 실려 있었다. 특별한 기억은 없지만 그 앞에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반가웠다.
묵호극장이 이름을 바꾼 동해극장 역시 오래전 사라졌다. 한때 지역마다 도심을 상징하던 단관 극장들이 있었다. 1970년대 들어 영화산업이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도심의 상징과도 같던 단관극장 역시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2000년대 멀티플렉스의 출현으로, 단관극장은 과거의 유물처럼 취급됐고 이제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몇년 전부터 원주의 유일한 단관극장인 원주 아카데미극장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결국 최근에 원주시는 철거를 확정했다고 한다. 원주 아카데미극장의 극적인 부활을 기대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낡은 사진 속 사라진 풍경들이 보여주듯, 사라진 것들을 추억하는 것은 쉽지만 남아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묵호극장의 낡은 사진을 보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물 같은 정책은 어디 없을까 생각해 본다.
▲한상언 영화연구소대표·영화학 박사·영화사가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